<이원호 경제톡> 관세 장벽 넘어선 K-수출의 힘
2025-10-20
그는 먼저 커피메이커, 장난감, 아이 신발, 전자제품, 심지어 크리스마스 장식품까지 거의 모든 소비재에 ‘Made in China’ 라벨이 붙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또한 중국산을 대체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미국, 유럽, 동남아 제품을 수소문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아예 제품 없이 생활하는 선택을 해야 했다. 그는 ‘중국 없이’ 1년을 살았지만, 대신 편리함, 비용, 선택의 자유를 크게 희생했다고 회상한다. 결국 그는 ‘세계화된 경제에서는 어느 한 국가를 완전히 배제하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결론을 맺는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실험과 반대로, 최근 세계는 한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발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와 고율의 관세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물론 EU, 일본, 한국 등 전통 우방국에까지 강도 높은 관세 압박과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자동차에 대한 비판, 한국과 무역 협정 재협상, EU와 무역 전쟁 위협 등은 많은 국가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미국이 더 이상 ‘글로벌 협력자’가 아니라 ‘거래 우위 확보자’로 변모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무역 압력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아 ‘탈(脫) 미국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EU는 일본, 인도, 캐나다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과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다자무역 체제를 논의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국방 자립도를 높이며 안보도 미국 중심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 금융 영역에서는 미국 주도의 ‘가상자산 규제’에 반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반도체나 배터리 등 미래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 의존도 줄이려는 기술 독립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없이 살아보기’가 아직까지 공식적인 구호로 나온 것은 없고, 개인적인 실험과 달리 국가 차원에서의 시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제 협력 구도에서 미국 중심의 질서에 대한 대안 찾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가상의 시나리오지만 만약 세계가 미국과의 경제 교류를 최소화하거나 단절하는 상황이 온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궁금하기는 하다. 정치·사회·문화적 요소는 배제하고 순수한 경제적 측면만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금융시장의 충격이다. 미국 달러는 여전히 기축통화이다. 국제 결제, 원자재 거래, 외환보유고의 중심을 대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유로화, 위안화, 비트코인 등의 대안이 있지만 신뢰성·유동성 면에서 완전하게 대체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둘째는 기술 공급망의 타격이다. 반도체, 항공, 클라우드 컴퓨팅, 금융 핀테크 등 고부가가치 기술은 아직까지 미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이를 완전히 대체하려면 막대한 기술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소비재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중국, 독일, 한국, 일본 등의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소비재 부문은 비교적 충격이 적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오히려 자신이 만들어 온 세계화 질서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급망의 자국 회귀, 자국 산업 보호, 외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사실상의 ‘탈세계화’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하나의 경제를 배제해도 불편한 세계화의 시대에, 세계 중심 국가인 미국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려 한다면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모두가 연결된 글로벌 시스템 속에서 어느 한 국가의 배제, 특히 미국과 같은 핵심 국가의 탈퇴는 세계경제 전체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세계화는 협력과 상호의존을 바탕으로 어느 한 국가도 소외되지 않고 공존하는 경제 질서를 의미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방주의나 배척이 아니다. 복원력 있는 공급망과 균형 있는 협력 체계가 필수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은 이 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이원호 비즈빅데이터연구소장(경제학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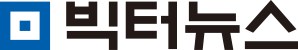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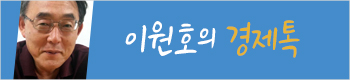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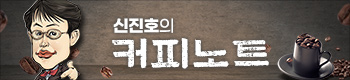












댓글
(0) 로그아웃